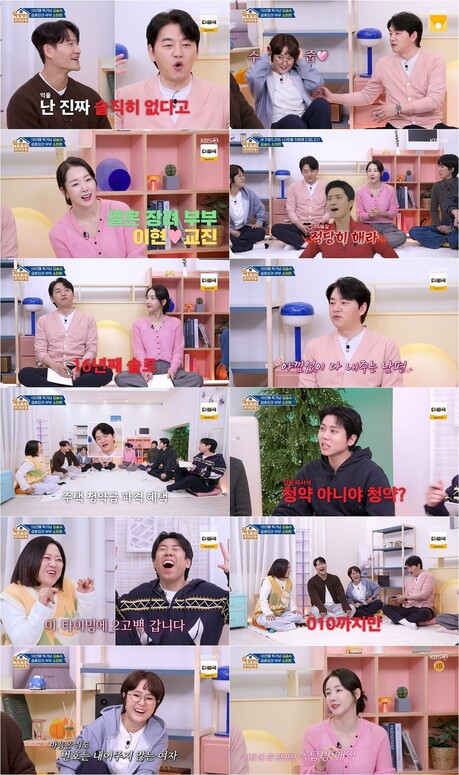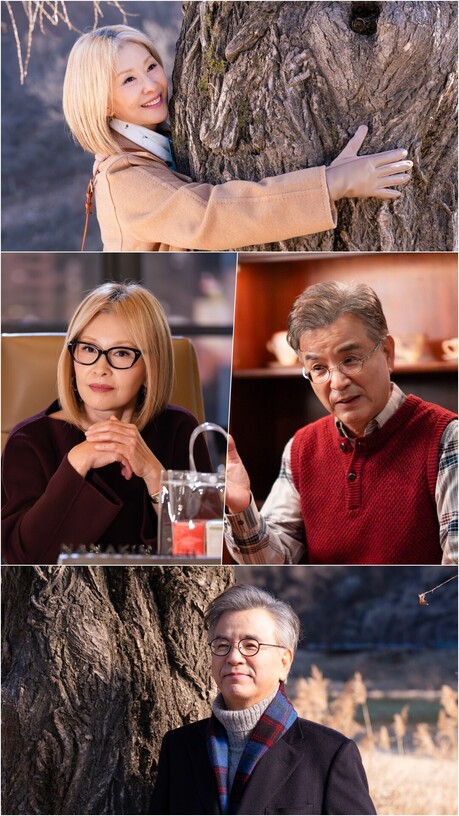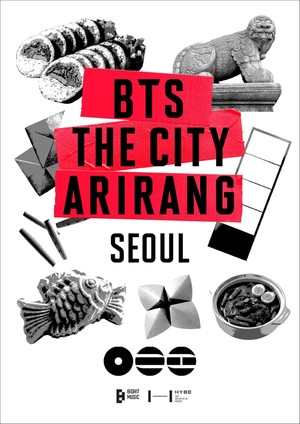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는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는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해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