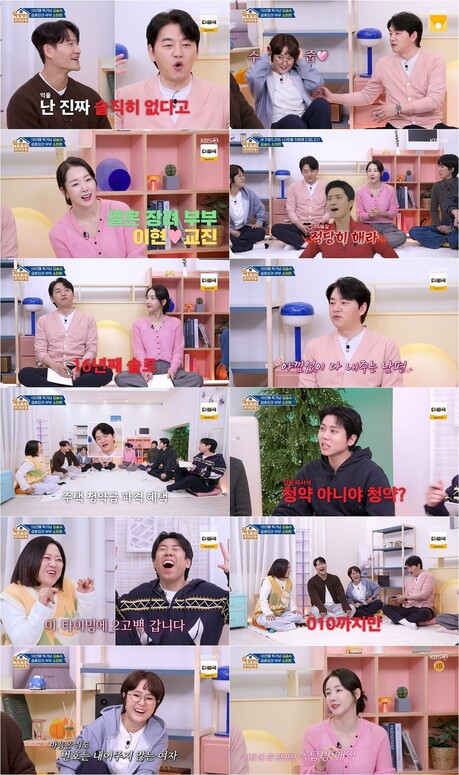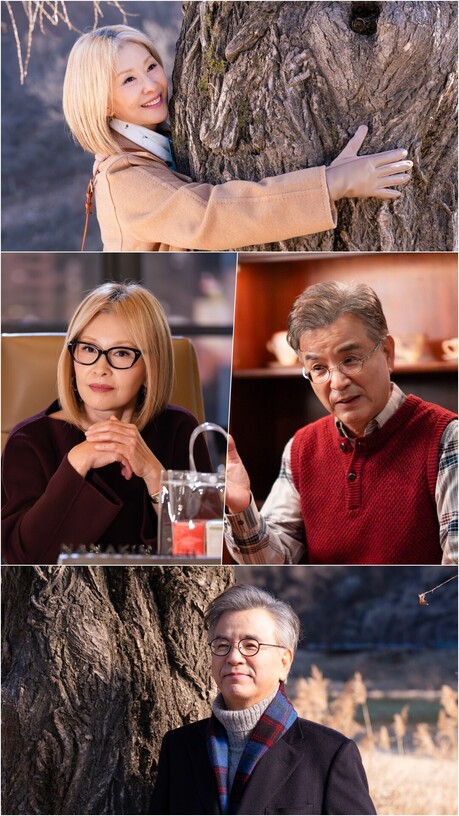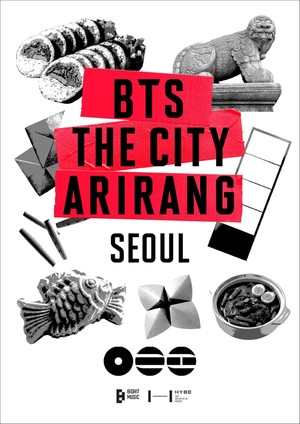지하철 노약자석이 비어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지난 2일 자정이 넘은 지하철 안 (2호선)은 늦은 귀갓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로 꽉차있다. 하루 피곤을 잠시라도 덜기 위해 지하철 문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술기운으로 인해 졸음이 쏟아지는 지 승객 한명은 아예 지하철 양쪽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잠을 자는 듯 웃지 못 할 상황도 눈에 뛴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자가 본 지하철 안의 사람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석은 비어있어도 선뜻 앉지를 않았다.
몇 년 전 모 CF에서 젊은 대학생이 운동 중에 다친 다리로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탄다. 비어있는 좌석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석뿐. 그러나 좌석을 보며 “우리 자리가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라는 광고문구가 뜬다.
그럼 장애인·노약자·임산부석은 누구의 자리?
말 그대로 장애인과 임산부 그리고 노인과 몸이 약한 사람이 앉는 자리를 일컫는다.
그래서인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 자리는 어쩐지 앉기가 꺼려진다. 그래서 아예 서서 가게 된다. 혹 앉더라도 매번 문이 열릴 때마다 쳐다보게 된다. 젊은 나이에 서서가도 무리는 없겠지만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설사 그 자리에 앉더라도 불편하다.
직장인 방미정(여.25.사당동)씨는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일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 몸이 피곤하지만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으면 왠지 주위에 불편한 시선이 느껴져 그냥 서서간다”고 한다. 또 대학생 박철희(남.20.청담동)군은 자리가 비워져 있을 경우 앉아서 가다가 노인이나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여 준다“고 한다.
이렇듯 일반 시민들 중에도 평상시 장애인·노약자·임산부석이 비었을 때 ‘비어나야 한다’와 ‘노약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나눠져 선뜻 답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령인구가 늘고 노약자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 장애인·노약자·임산부석의 명칭을 ‘교통약자배려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통약자배려석’은 평상시에는 누구나 좌석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노약자보호석(현재 12석)외에 일반석 2곳(앞 좌측, 뒤 우측 각 7석)을 추가 지정해 기존 12석에서 26석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앞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지침에 따라 ‘교통약자배려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픽토그램(상징문자)이 확정되면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새로 바뀔 ‘교통약자배려석’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선화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