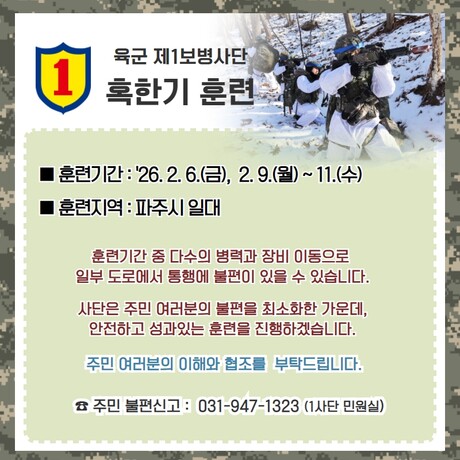[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벌겋게 달궈진 화로 앞, 탕탕 망치질하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하다.
일흔다섯 나이가 무색하게 육중한 망치를 들어 모루를 향해 내리치는 어깨에 기운이 넘친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망치를 놓지 않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충북 무형문화재 13호) 선생이다.
1대장간을 뜻하는 한자 풀무 야(冶), 장인을 뜻하는 장(匠)이 합쳐진 야장은 우리말로 대장장이다. 요즘은 대장간을 만나기 어렵지만 옆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 달군 쇳덩어리로 도구를 만드는 그에게 ‘장인’이라는 호칭이 붙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작은 호미 하나를 만드는 데 20번 가까운 담금질과 1000번이 넘는 망치질이 필요하다. 손잡이를 끼우는 슴베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기계로 찍어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력겱챨즯정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고관대작의 안방에 걸리는 장식품도 아니고 값나가는 물건도 아니지만 모루에 올려놓고 모양을 잡아가는 동안 눈빛에 흐트러짐이 없다. 때로는 거침없고, 때로는 아이를 달래듯 조심스러운 망치질 소리는 묵직하면서도 변화무쌍하다.
요즘은 공장 기계를 통해 몇 분 만에 수십 개씩 물건들이 쏟아지지만 김명일 선생의 삼화대장간에 똑같은 물건은 없다. 모두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한 명품이기 때문이다. 호미며 낫, 칼은 물론이고 쇠스랑과 긁개 같은 농사 도구부터 소 목에 거는 도래, 문고리, 화로 같은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다.

<야장 김명일>
원래 대장간 자리에서 누리장터의 현대식 건물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만들어낸 물건들은 화로와 모루 앞을 지킨 세월을 말해주는 듯 한결같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럽다.
손바닥에 박인 굳은살과 상처마저 보듬어준 시간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린 시절 마차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재미 삼아 풀무질을 배웠고 1953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근 대장간 일을 거들며 용돈을 벌고 취직도 했다.
다른 일을 하리라 마음먹고 입대했지만 육군 무기 보급창에 배치되어 또다시 철을 녹이고 두드리며 3년을 보냈다. 이처럼 야장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오는 동안 호기롭던 청년은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망치를 들고 모루 앞에 선다. 아버지의 마차 공장에서 사용하던 모루며 바이스 같은 낡은 도구와 연장도 보낸 세월만큼 자랑스러운 가보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대장간도 이제는 힘겹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농번기가 되어도 사람들은 값싼 중국산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손님이 적어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자부심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삼화대장간의 물건은 튼튼하기로 유명하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